시 <산도화>와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의 연결고리
- 르네상스 21C
- 2020년 7월 17일
- 2분 분량
<산도화>는 1955년에 간행된 박목월의 첫 개인시집이다. 이 시집에 수록된 대표작 <산도화1>은 봄이 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담아낸 시이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산도화>
박목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시인은 석산의 풍경을 인상적인 몇 장면으로만 구현하고, 두어 송이 핀 산도화를 묘사하여여백의 미를 나타낸다. 절제된 언어의 사용은 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짤막한 시를 통해 독자는 동양적 이상세계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시냇물에 발을 씻고 있는 사슴을 통통해 시인의 자연 친화 의식을 엿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함축’과 ‘자연 친화 의식’은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도화>는 ‘산은/구강산/보랏빛 석산’라는 시구를 읽으면 알 수 있듯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시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음보율 중심의 운율 감각이 드러난다는 것은 <산도화>에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이다.
- 그림1 / 그림 2, 모두 출판사 제공
<민들레와 민들레>(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는 민들레의 생애를 담은 그림책이다. 싹이 돋아난 민들레,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는 민들레, 가로수 아래 피어 있는 민들레, 기왓장 사이를 비집고 피어난 민들레, 혼자 있는 민들레, 모여 있는 민들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민들레는 민들레’라고 말한다. 이 그림책 속 민들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 같다. 사람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느 곳에 살든 혼자 있든 누군가와 같이 있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그림책을 덮고 난 후, 모두 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을 일어나는 걸까, 라는 물음이 들었다.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그림책과 <산도화>의 주제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두 작품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산도화>와 <민들레는 민들레> 모두 자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앞서 말했듯 <산도화>는 산, 산도화, 물, 사슴을, <민들레는 민들레>는 민들레를 통해 각각의 주제를 이야기한다. 작가가 포착한 자연은 작품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두 작품은 그 자연을 드러낸 방식에서도 유사하다. <산도화>의 2, 3, 4연에서는 대상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도록 묘사한다. <민들레는 민들레>도 다양한 모습의 민들레를 카메라로 클로즈업하여 찍은 듯 그렸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뚜렷한 사건 없이 그 자연을 묘사하기만 한다. 맨 처음에는 사건 없이 글을 써도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을 읽고 나서 사건이 없더라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으며,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들레는 민들레>의 문장도 <산도화>처럼 대게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꽃줄기가 쏘옥 올라와도’, 그다음 페이지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문장을 배치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았을 때, ‘3음보’와 특정한 단어 ‘민들레는 민들레’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짧은 노래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이 그림책에서도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산도화>는 두어 송이 핀 산도화를 글로 묘사했고, <민들레는 민들레>는 하얀 공간이 남도록 민들레를 그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되든 간에 독자들은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무한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여백’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아 탐구의 원동력이 되었던 실학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미완성의 공간이 아닌 상상력을 확대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면들에서 시 <산도화>와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는 닮아있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은 ‘한국 전통문화를 글, 그림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힌트를 주는 작품들이다. <산도화>,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한국 전통문화 중에서도 여백의 미를 살린 작품을 창작해보고 싶다. 또한 꽃처럼 한국 문학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다져진 토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한국 전통문화를 문학작품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w.2835 허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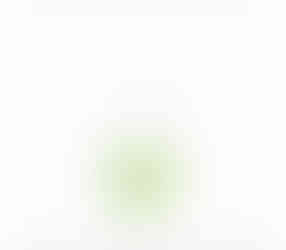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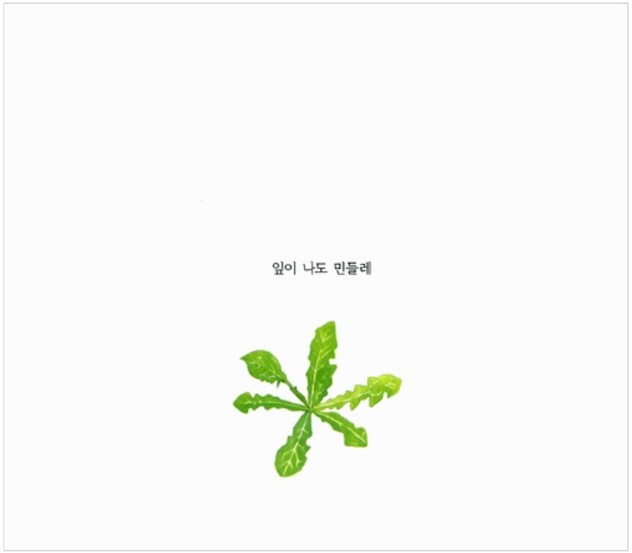
댓글